[인디즈 소소대담] 2023. 7 소소한 휴가
*소소대담: 인디스페이스 관객기자단 ‘인디즈’의 정기 모임
*관객기자단 [인디즈] 진연우 님의 기록입니다.
참석자: 숲, 풀, 잎, 꽃
뜻밖의 휴가처럼 조금은 얼떨떨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거창하지 않아도 이름처럼 소소했고, 좁혀진 거리만큼 마음은 넓어졌다. 이날의 얼굴들을 오래 기억하고 있다. 한층 이완된 마음으로 마주한 서로를 여름의 기억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 최근 독립영화 개봉작에 대해서

〈수라〉
[리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조영은)
숲: 소중한 영화였다. 영화에서 아름다운 장면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아름다움을 본 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내몰려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 같았다. 새만금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생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와 등치해 사람의 문제로 같은 층위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인간이 위에 있고, 동물이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슬픔과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장면들-예컨대 故류미화 씨의 죽음-뒤에 동물들을 배치함으로써 동물들의 감정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연결됨을 말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더해 주었다. 생태 영화이지만, 동시에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다.
꽃: '숲'과 함께 〈수라〉를 보고 이야기 했었는데, "이 영화 정말 '버텨내고 존재하기'잖아!"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작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본 영화 중에 〈버텨내고 존재하기〉(권철, 2022)를 무척 좋아한다. 영화가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제목 자체에 담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라〉가 좋았던 것과 동시에 버텨내고 존재하는 영화이기에 글을 더 잘 쓰고 싶었다. 그런 지점들이 보는 내내 마음에 떠올랐고 글에 잘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풀: 다큐멘터리 영화의 형식을 논할 만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영화만 놓고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동어 반복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감독의 시선에서 서술되는 일들이 새만금 이슈로 환원되는 구조인데, 세부적인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장마다 다다르는 결론이 비슷해서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슈 파이팅의 목적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 새만금을 둘러싼 쟁점들을 한데 엮어 보여 주려는 감독의 의도가 이해가 갔고, 이곳에 와서 〈수라〉가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에 얽힌 개인의 기억을 공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 준 뒤에 그것을 바라보는 감독 자신의 리액션 숏을 삽입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숲’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리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김채운)
[인디토크]: 남겨진 '애도'라는 물음(조영은)
잎: 감독의 전작 〈프랑스 여자〉에서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방식이 좋았다. 이야기를 잘 풀어낸다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소설 원작이라서 그랬는지 대사가 툭툭 끊기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방식을 감독의 장기를 살려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다.
숲: '잎'의 감상에 공감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울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설정들도 좋고, 캐릭터도 영화로 만들어 내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 영화로 느낄 만한 게 전혀 없었다. 캐릭터도 새로 만들어 내고, 광주와 폴란드까지 더 많은 사회적인 함의들을 넣으려고 시도한 것은 알겠지만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영화라는 매체의 전달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영화 시작할 때 나오던 사람들의 일이 광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전남도청 건물이 부서져서 나올 때 '그렇게 읽어 주세요.' 말고 더 어떤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리고 광주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죽은 사람'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사회적인 코드를 읽었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차 그렇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을 건네니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으나 영화로서는 매력이 없었다. 덧붙여 시의성과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하나로 짚어 내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 게 이 영화는 사회적 죽음과 그것을 겪어 낸 사람들 사이의 연결된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연결됨'이라는 감각에도 의구심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 있다. 이를테면 죽은 남편과의 행복한 한때를 떠올리는 장면이 처음으로 제시되는데 남편이 "시리야, 나랑 잘래?" 하면서 시리한테 성희롱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폴란드 동창 장면도 그러한데, 폴란드에서 동창이 주인공에게 하는 말도 따지자면 맨스플레인 아닌가. '저런 대사를 2023년에 저런 의도로 쓰는 게 요즈음의 감성인가?'라는 질문에 다다랐을 때, 동시대성과 연결됨을 말하고 있는 영화에서 '저 사람과 나는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그리지 않는 게 맞다가 아니라 저런 말을 해도 애도할 수 있고, 슬프고, 선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애도하고 싶지만 그걸 행복한 한때로 그리는 순간 개인적으로는 그 '연결감'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 같다.
*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
풀: 사실 남들보다 영화를 늦게 좋아한 편이라 이런 이야기에서는 늘 주눅이 든다. (웃음) 영화를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강렬한 기억 중 하나가 〈라라랜드〉였다. 스크린에서 처음 보고 뇌를 얻어맞는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전까지는 영화관에 그렇게 자주 가지도 않았고 영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취향이랄 게 전무한 상태였다. 그때가 한창 페이스북 같은 곳에 〈어바웃 타임〉이나 〈노트북〉 같은 영화의 추천 글이 올라올 즈음이었는데, 영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집에서 도피할 곳을 찾기 위해 한 편, 두 편 유명한 영화들을 찾아보던 시기였다. 그런 시기에 스크린에서 봤던 〈라라랜드〉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영화 한 편에 50만원을 넘게 썼으니 지금 생각하면 광기이고, 사실은 어떤 시기에 대한 분출구였던 것 같다. 그래서 계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차라리 스며든 편에 가깝다. 그냥 함께 견뎌 준 시간과 그때 그 시간들이고, 우연히 만난 영화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주었다. 그때부터 영화관이 도피처가 되었고, 집 삼은 영화들도 많다.
숲: 사람들을 이어 내는 감각이 좋았다. '풀'과는 반대로 영화를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TV에서 하는 영화 채널을 자주 보셔서 그 옆에서 같이 보다가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도 계속 영화를 보게 되었던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남들에게 말 못 할 때, 나의 생각이나 정체성이 있는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기분을 평생 느끼면서 살아 왔는데, 그런 걸 영화 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해소했다. 〈매그놀리아〉를 봤을 때 혼자서 엉엉 울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슬픔이 느껴져서. 아마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것 같은데 그때의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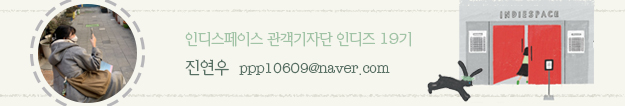
'Community > 관객기자단 [인디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디즈 Review] 〈퀴어 마이 프렌즈〉: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0) | 2023.08.23 |
|---|---|
| [인디즈 Review] 〈다섯 번째 흉추〉: 보존과 영원 (1) | 2023.08.21 |
| [인디즈 Review] 〈비닐하우스〉: 앙상하게 드러난 존재의 감각 (0) | 2023.08.10 |
| [인디즈] 〈작은정원〉인디토크 기록: 언니들이 피워낸 영화라는 꽃이 우리에게 닿아서 (0) | 2023.08.10 |
| [썸머프라이드시네마 2023] 김해나 배우 인터뷰 (0) | 2023.08.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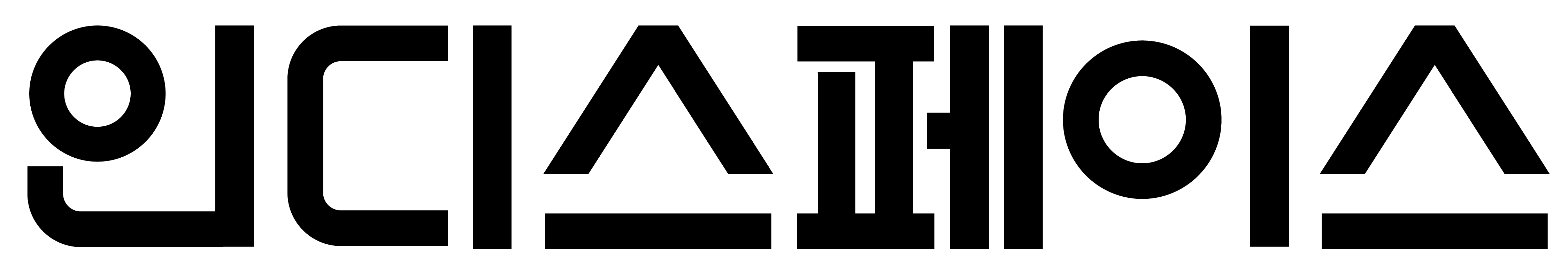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