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즈 소소대담] 2025. 4 만남이 주는 모든 것
*소소대담: 인디스페이스 관객기자단 ‘인디즈’의 정기 모임
*관객기자단 [인디즈] 박은아 님의 기록입니다.
참석자: 기타, 드럼, 피아노, 베이스, 마이크, 신디사이저
아직은 서늘한 봄바람이 부는 4월,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려 애를 쓰게 되는 날들의 연속이다. 영화로 모이고 영화로 흩어지는 길목에서 만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가보기로 약속한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서로가 담아두었던 장면들을 내보이는 수줍음이 못내 간지럽기도 하다. 언젠가 사뭇 달라진 우리를 보리라는 기대와 함께 가벼운 웃음으로 풀어보는 순간의 다정함이 마주할 날들에 깃들기를 바라며.
*2025년 4월에 극장에서 만난 영화들

〈프랑켄슈타인 아버지〉
[리뷰]: 닮은 꼴 찾기(남홍석)
[단평]: 삶각형(강신정)
[뉴스레터]: Q. 🤔 (하나도 안 닮았지만) 가족입니다? (2025.4.23)
드럼: 강길우 배우의 매력이 잘 느껴졌어요. 특히 영화에서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라는 말처럼 육체로부터 비롯된, 자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생물학적 아버지인 '도치성'(배우 강길우)와 유전적 결함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씬이 위트 있다고 느껴졌어요.
베이스: 각자의 부모와 멀어지는 이야기 같아요. 상대와 물리적 거리감이 생기면서 의지할 곳 없는 불안감, 기른 정과 낳은 정 속에서 느끼는 청소년기의 불안 같은 감정들이 영화로서 발화된 것 같고요. 인물들이 타인 혹은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해요.
* 우리가 만날 영화 너머의 사람들은
드럼: 신작 중심의 독립영화 감독론을 써보고 싶어요. 다만 감독들의 이전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OTT에도 없는 작품들도 있고요. 최대한 많이 보고, 쓰고 싶은데 창구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의 정보들을 쓰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해요.
기타: 요즘 영화 기획전의 인기가 좋잖아요. 단순히 (많은 관객 동원에 성공한)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관객들이 어떤 이유로 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는지를 인터뷰해 보고 싶어요. 예전과 비교해서 관객들의 수준이 깊어졌다고 느껴요. 영화뿐만 아니라 관객들을 탐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베이스: 영화제 기획자들과는 다르게 자체 시네클럽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은 점도 인상적이에요. 상영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속도도 시네클럽은 굉장히 빠르고요. 가끔은 시네클럽의 기획이 영화제의 특별프로그램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드럼: 함께 모여 보는 공동체 상영의 모습도 궁금하고요, 영화관에 있던 사람들은 문밖을 나서서 각자 어디로 향할지도 궁금해요. 또 어떻게 서로 모이게 되는지, 그들만의 공통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피아노: 저도 비슷하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모두 영화관에 앉아 타인과 섞여 영화를 보는 것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대신 영화잡지라던가 타 매체에서 할 법한 인터뷰 말고,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어요. 대가성 없는 인터뷰요. 그래서 우리 인디즈 23기분들을 인터뷰하면 어떨지 생각했어요. (웃음)
* 또다시 시작될 영화제
베이스: 곧 다가오는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영화의 '바로미터' 같아요. 이 영화제를 시작으로 정동진독립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등등에서 한국 장/단편 독립영화들이 쭉 상영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영화제 때 취향에 따라 꼭 보는 섹션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보통 한국 장편의 경우에는 극장 개봉이나 다른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겠지 싶더라고요.
드럼: 전주국제영화제는 가자 지구를 다룬 작품도 그렇고, 대안 영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베이스: 한국 독립영화 생태계를 알게 되는 것도 같아요. 올해 1월에 개봉했던 〈부모 바보〉는 배급을 감독이 홀로 진행해서 개봉한 작품이었고 전체 관람객의 수가 1,100여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의 한국단편경쟁 출품작 수가 1,510편이더라고요. 영화제가 소개 글에서 밝힌 것처럼 영화를 보는 관객보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더 많아진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논란이 있는 감독의 작품을 관람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돼요. 영화 작품과 감독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하게 돼요. 논란이 있는 감독의 영화는 영원히 보면 안 되는 영화일까요?
피아노: 일반화할 수 없지만, 영화과 사이에서 이런 영화(노동자, 소수자의 이야기 등)를 해야 영화제에 출품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영화를 만드는 것일지 생각했어요. 클레어 데더러의 『괴물들』이라는 책에서도 같은 고민을 갖고 바라봐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 예술과 예술가를 구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정확한 대답을 내려주진 않지만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도 명확한 결말을 맺기엔 아직 먼 것 같아요.

'Community > 관객기자단 [인디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디즈 Review] 〈리셋〉: 영화적 타임머신 (2) | 2025.05.19 |
|---|---|
| [인디즈 단평] 〈리셋〉: 살아가는 일상과 몫 (0) | 2025.05.14 |
| [인디즈] 〈침몰가족〉 인디토크 기록: 미래로 열린 집 (0) | 2025.05.08 |
| [인디즈 Review]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기록이 전해지기까지 (2) | 2025.05.02 |
| [인디즈 Review] 〈귀신들〉: 사람과 AI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존재들 (2) | 2025.04.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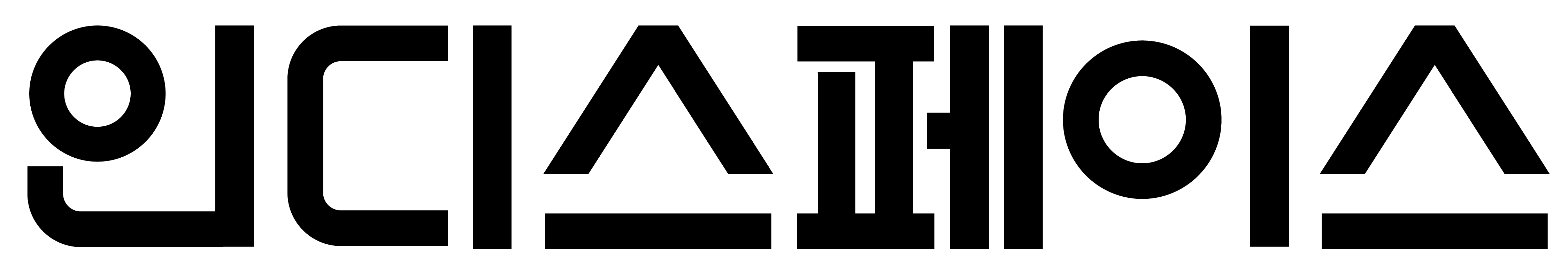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