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의 빛〉리뷰: 청소년의 서사
* 관객기자단 [인디즈] 남홍석 님의 글입니다.
이상한 영화
이상한 영화다. 아니, 이상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작년 여름 공개된 이후로 수많은 찬반 의견이 오갔던 〈에스퍼의 빛〉을 처음 보고 들었던 생각이다. 트위터(현 X) 자캐 커뮤 문화에 기반한 이 작품은 10대 청소년들의 자캐 커뮤 '플레이'를 그대로 영화로 옮긴다. '플레이어'들은 모두 엔딩크레딧에 공동 각본가로 올라가 있고, 몇몇은 배우로 자신의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한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의 프리미어 상영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강한 수위의 비판이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제작 과정을 비롯한 외재적 맥락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영화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에스퍼의 빛〉은 의도를 감추기는커녕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영화다. 청소년들의 서사를 표현하기 위해 함께 각본을 작업하고, 그들을 스크린에 등장시킨다. 카메라는 오프닝 직후 게임의 플레이어들을 한 사람씩 조명한다. 영화는 캐릭터 뒤에 현실의 플레이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이 없고, 오히려 중간중간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삽입한다. 선택지를 비롯한 게임의 주요 공지는 트위터의 인터페이스를 본떠 만든 그래픽 효과로 제시된다. 〈에스퍼의 빛〉은 각본가가 창조한 세계에 관객을 이입시키려는 픽션 영화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늘날의 서사가 창조되는 과정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에 가깝다. 실제로 감독은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분류했다. 이상한, 아니 솔직한 작품이다.

디스플레이를 넘어
그렇기에 현실과 게임 사이의 경계가 옅어지는 순간들은 더욱 흥미롭다. 어떤 플레이어는 캐릭터의 배경에 복싱 수업이라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투영한다. 플레이어들은 진동 알림으로 공지를 확인하고 플레이를 이어 나가는 한편,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도 보인다. 잠시 결원이 생겨도 게임은 계속 진행된다. 플레이어 모두가 늘 디스플레이를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두 세계는 분명 분리되어 있지만 양쪽을 오갈 수 있는 통로는 언제든 열려 있다. 진동 알림을 매개로 플레이어는 언제든 '이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
어딘가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화면 전환과 묘사 역시 자캐 커뮤 서사의 특성을 반영한다. 트윗 하나에 140자의 글자 제한을 두고 있는 트위터는 필연적으로 툭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구체적인 배경의 묘사보다는 짧은 감상의 나열처럼 구성된 서사는 이런 트위터의 모습과 닮아있다. 여러 인물이 동시에 말하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다소 의아하거나 갑작스러운 전개가 이어지는 특징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시에 다층의 감각을 경험하기보다는 빠르게 스크롤을 내리며 글을 읽는 듯한 느낌, 이것이 정재훈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오늘날 청소년의 서사일지도 모르겠다.

스크린 밖으로 발구르기
'청소년의 서사'를 다루는 영화에 자주 제기되는 비판이 있다. 결국 기성세대인 감독이 청소년의 마음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단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에스퍼의 빛〉의 엔딩을 되짚어보자. 플레이어들은 세계의 파괴를 극적으로 저지하고, 황무지에 자라난 무성한 식물과 함께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다. 여기서 끝이 나겠거니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1부의 플레이어 한 명이 재등장해 힘차게 스케이트보드를 탄다. 게임 내에서 출발했던 영화는 현실, 그리고 프레임 밖으로 향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끝난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정석적인 다큐멘터리의 결말이라기엔 다소 극적이다. 깔끔한 카메라 구도와 어딘가 결연해 보이는 표정, 연출의 흔적이 다분히 묻어나는 숏. 이 장면은 위에서 언급한 우려에 대한 영화 나름의 대답일지도 모른다. '청소년의 서사'는 납작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크롤의 위아래 움직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측면만 보여주는 행위는 오늘날 청소년의 마음은 어떠하다고 프레임화하는 행위에 그치고 만다. 엔딩에 등장하는 플레이어는 영화 중반부에 플레이를 중단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현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역시 결코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을, 스크린 밖으로 횡이동하며 맹렬히 발을 구르는 플레이어-청소년이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Community > 관객기자단 [인디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디즈 단평] 〈너와 나의 5분〉 : 5분 사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관계 (0) | 2025.11.17 |
|---|---|
| [인디즈 단평] 〈에스퍼의 빛〉 : 보편성으로부터의 탈피 (0) | 2025.11.17 |
| [인디즈 소소대담] 2025. 10 영화의 끝과 시작 (1) | 2025.11.11 |
| [인디즈 Review] 〈1980 사북〉: 미완의 역사 앞에서 (0) | 2025.11.11 |
| [인디즈 Review] 〈바얌섬〉: 사는 동안은 우습게, 느릿하게. (1) | 2025.11.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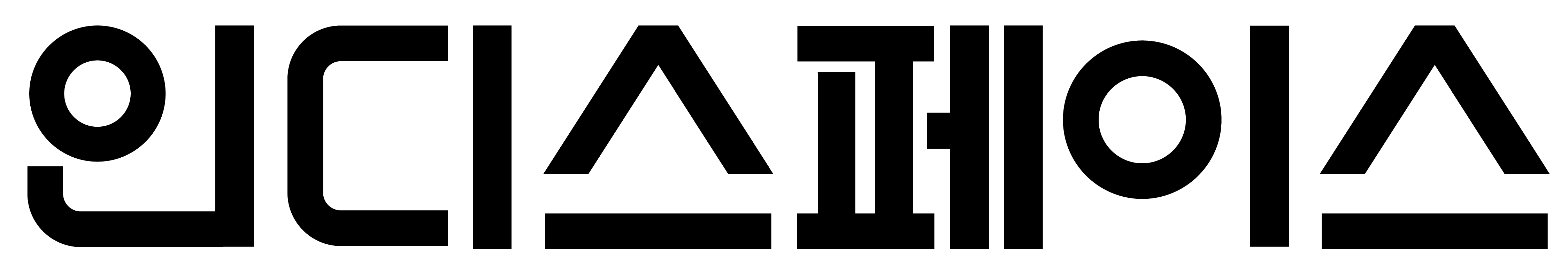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