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뷰: 훔쳐 읽는 편지
* 관객기자단 [인디즈] 문충원 님의 글입니다.
유럽은 길거리에서 많은 일이 일어난다. 테라스나 벤치, 잔디밭이나 길바닥 위에서. 걸터앉거나, 쭈그리거나, 혹은 드러누워서. 먹고 마시고 대화한다. 알 수 없는 말들이 백색소음처럼 오간다. 그리고 이따금 무언가가 피어오른다. 태우고 빨아들이고 내뱉는다. 하얀 연기가 드문드문 번지던 작은 광장에서 한 지인의 말을 기억한다. 이게 대마 냄새야. 일반 담배랑은 확실히 달라. 공교롭게도 그날 나는 그 냄새를 맡지 못했다. 대마에 관한 기억은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상은 단 하나. 대마 근처에 있기도 역하다는 지인의 표정, 그리고 맡지도 못했으면서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던 나 자신.
우리는 어쩌다 대마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었나. 대마에 손댄 공인들은 왜 감옥에 가나. 우린 불법인데 먼 나라 사람들은 왜 그리도 즐기고 있나. 단지 문화 차이로 단정 짓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우리 대부분은 대마를 잘 모른 채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니. 영화 〈풀〉은 그런 파편적인 관행에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대마초가 불법으로 지정된 역사부터 대마초의 치유적 효능, 탄소 포집을 비롯한 환경문제 해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허준의 동의보감과 국내외 논문을 근거로 대마의 약리적 성분을 소개하고 인식을 전환하기도 한다. 영화 속 대마초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평화운동의 성격을 띄기도 하며, 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므로 이건 인류에게 좋은 풀 같다. 적어도 영화 안에서만큼은.

〈풀〉이 편지의 형식을 취하는 건 이런 이유가 아닐까. 대마초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영화는 대마초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내밀함을 택한다. 영화는 대마초에게 문자 그대로 편지를 쓰며 궁금한 점을 묻는다. ‘너’라는 인격을 부여하며 내레이션도 없이 긴 자막 텍스트로 장면 사이사이마다 한 문장씩 써 내려간다. 다시 말해 〈풀〉은 편향적인 주장을 개인적으로 말하는 영화이다.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이지만 기본적으로 발신자의 일방적인 전달에서 비롯된다. 발신자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되고,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감정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된다. 영화는 무턱대고 써 내린 편지의 공란을 생생하고 투박하며 전문적인 인물들의 말로 채워 넣는다. 대마의 치유적 효과를 직접 경험한 전직 의사, 파주 접경지역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농부, 네덜란드에서 대마 문화와 함께한 천문학자, 대마초 합법화를 노래하는 래퍼 등 연관 인물들이 자신만의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렇게 진심까지 더해진 편지는 정말로 ‘편지’다워진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편지의 수신자도 발신자도 아닌 제3의 독자 위치에 놓인다. 남의 편지를 엿보는 사람은 웃어넘길지언정 평가하지 않는다. 상대의 내밀함을 의심하지도 않는다. 대마초 반대 여론이 강한 한국에서 소수의 주장은 그렇게 최소한의 보호막을 획득한다. 기존 인식과 상반되는 주장과 마주할 때 오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풀〉은 교묘하게 피해 가기로 한다. 이 거부감은 지금껏 대마가 겪어온 그것과 같지만 영화만은 그 과오를 따라가지 않기로 한다. 대마초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도 ‘풀’이라고 뭉뚱그리며, 혹은 일상화하며 정체성을 흐리고 편지의 형식으로 굽이굽이 돌아가 은근히 전하는 영화는 극장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와 만난다.

이 간극의 틈새에서 〈풀〉은 자란다. 한국 사회에서 뿌리내릴 자리를 겨우 마련하는 식으로. 일단 뿌리를 내려야 논의는 시작된다. 이 편지가 ‘풀’에게 가닿을 수 있을까? 영화 막바지, 희망은 거대한 권력에 가로막히고 누군가는 한국을 떠났지만 영화는 우편처럼 우리 앞에 도착했다. 다시 넘길지, 혹은 새롭게 써 내려갈지는 건네받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

'Community > 관객기자단 [인디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디즈] 〈귤레귤레〉 인디토크 기록: 사랑도 졸업이 되나요? (7) | 2025.07.08 |
|---|---|
| [인디즈 Review] 〈바다호랑이〉: 스크린과 객석 사이, 이야기와 현실 사이 (6) | 2025.07.08 |
| [인디즈 단평] 〈레슨〉: 연습과 실패 (0) | 2025.07.08 |
| [인디즈 Review] 〈레슨〉: 몽유병자의 초상 (0) | 2025.07.08 |
| [인디즈 단평] 〈풀〉: 균열 내 보기 (0) | 2025.06.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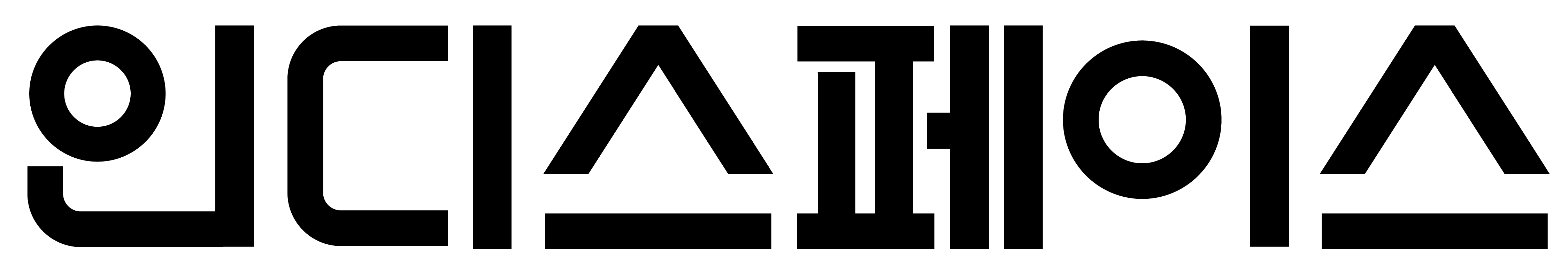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