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호랑이〉리뷰: 스크린과 객석 사이, 이야기와 현실 사이
* 관객기자단 [인디즈] 정다원 님의 글입니다.
스크린과 객석의 거리를 잴 수 있을까? 스크린 속의 이야기를 만날 때면 우리는 장면 속의 인물의 감정에 동요한다. 하지만 이 흔들림은 현실의 것처럼 생경하지만은 않다.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며 공감하는 일에 가깝다. 즉 영화와 ‘나’ 사이의 거리는 딱 이야기와 현실만큼의 거리감을 유지한다. 영화 〈바다호랑이〉는 여전히 현재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삶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영화 세트장에 관객을 초대한다. 배우의 말 한마디로도 극장이 현장으로 교체되는 연극처럼, 나경수의 대사를 시작으로 스크린과 객석의 경계를 지우며 영화는 막을 연다.

2014년 세월호 탐사 현장의 자리를 지킨 많은 사람의 시선 중에서도 민간 잠수사 나경수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는 진행된다. 그해 봄, 세월호 침몰 현장에 투입되어 아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가족의 품으로 데려다준 그는 참사 현장의 기억에 서서히 무너진다. 잠수병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며 떠올리기조차 괴로운 고통의 기억에 시달린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 대표 류창대에게 동료 잠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법정의 증인으로 서게 된 그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 보기를 선택한다. 이야기는 ‘나경수’를 그저 구조자로만 묘사하지 않는다. 살아남은 자로, 고통에 시달리는 자로, 용서를 받고 용기를 낸 약하고도 강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민간 잠수사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화의 연극적 연출은 우리가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저 책상만으로 법정을, 조명과 음향으로 바다를 표현하는 추상적 세트는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은 우리의 상상으로 채워진다. 즉 이야기는 나의 생각으로 함께 구체화된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것이다. 추상화된 공백은 개인의 상상으로 채워진 완전한 이야기가 되고 그 어떤 세트도 표현할 수 없을 그날의 생생한 슬픔을, 여전한 아픔을 우리의 것으로 바꾼다.

그날의 이야기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다. 하나의 거대한 아픔으로 다루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개인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영화 〈바다호랑이〉는 수면 아래에 깊게 새겨진 ‘우리’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오래도록 새겨질 ‘우리’의 현실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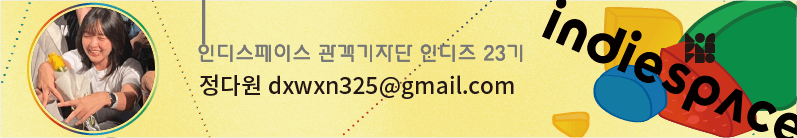
'Community > 관객기자단 [인디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디즈 단평] 〈바다호랑이〉: 붙잡고 가야 하는 기억 (2) | 2025.07.08 |
|---|---|
| [인디즈] 〈귤레귤레〉 인디토크 기록: 사랑도 졸업이 되나요? (7) | 2025.07.08 |
| [인디즈 Review] 〈풀〉: 훔쳐 읽는 편지 (4) | 2025.07.08 |
| [인디즈 단평] 〈레슨〉: 연습과 실패 (0) | 2025.07.08 |
| [인디즈 Review] 〈레슨〉: 몽유병자의 초상 (0) | 2025.07.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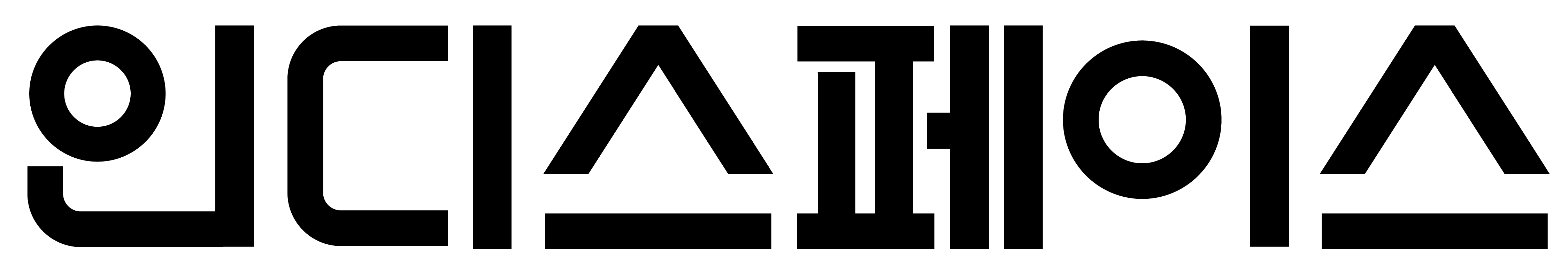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