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건축가〉, 그리고 〈2차 송환〉
말하는 얼굴의 의지와 존엄을 지키는 영화들
*관객기자단 [인디즈] 김태현 님의 글입니다.
〈2차 송환〉의 개봉을 맞아, 김동원 감독의 또 다른 영화를 소개하고 싶었다. 어렵지 않는 경로를 통해 관객들이 만날 수 있는 영화를 찾으며 〈송환〉과 〈내 친구 정일우〉를 다시 보았다. 두 영화 모두 소개해야 마땅한 감동적인 영화이지만, 〈2차 송환〉과는 다른 영화들이라고 생각했다. 두 영화 모두 〈2차 송환〉과 같이 현실의 문제를 전하며, 신념을 가진 인물 옆에 서 있는 영화이지만, 〈2차 송환〉과는 다른 동력으로 영화가 맺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기대감, 혹은 기억. 하지만 〈2차 송환〉은 어쩔 수 없이 실패에 대한 영화이다. 카메라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질문에 답하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얼굴에서 여전한 기대감과 순박한 인간미를 엿볼 수 있지만, 우리는 ‘2차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적인 현실을 알고 있다. 금강산의 땅을 밟으려던 시도는 마지막 순간에 좌절되고, 굳건하던 어떤 이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갈수록 딱딱해진다. 영화를 가득 채우던 그들의 말하는 얼굴은 너무나도 쉽게 실패의 정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2차 송환〉은 실패에 대한 좌절로 영화를 맺을 생각이 없다. 남북을 둘러싼 정치적인 지형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마음을 염려하게 되지만, 영화는 더 이상 그들에게 현실 인식을 질문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과, 뛰어들 바다와 햇살이 있는 여행과, 김영식 선생님의 출판기념 잔치를 담는다. 나빠져 가는 현실과 그에서 비롯된 실패를 함께 끌어안는 위치에 놓인 것은 연출가다. 그는 가족에 대한 내밀한 고백으로 시작해, 카메라를 들고 북한에 가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 되묻고, 제작 지원을 신청하며 ‘전향’하기도 하고, 북한을 촬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지만 결국 실패한다. 대체로 인물 옆에 앉아 질문하던 카메라는 이제 김동원 감독과 함께 앉아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기수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다. 많은 것들이 ‘2차 송환’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을 때, 영화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기대를 지키기 위해 그들과 떨어져 거리를 만들어 낸다. 그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드러난 김영식 선생님은 무력하지 않은 단단한 모습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그 선택이 무척이나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상하게도 정재은 감독의 〈말하는 건축가〉를 떠올리게 했다.
〈말하는 건축가〉는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무주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정기용 건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따라가며 그가 세상에 말하고자 했던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을 전한다. 두 영화를 서사적으로 이어볼 수도 있다. 〈2차 송환〉이 우리 앞의 시급한 정치적 문제와 그것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을 담아내고 있다면, 〈말하는 건축가〉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말하는 인물을 담는다. 각기 다른 사회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문제의식은 같은 사회를 딛고 사는 우리에게 공통된 의미를 던진다. 사회와 정치는 한 명의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두 영화의 닮은 점은 이야기라기보단, 실패 혹은 죽음에 대한 정념으로 영화를 끝맺지 않겠다는 의지다. 〈말하는 건축가〉는 정기용 건축가의 건축적 유산을 알리는 기록이기도 하지만, 삶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사람을 담아내는 기록이기도 하다.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그는 자신에게서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영화는 어쩔 수 없는 그의 쇠약을 담아내게 되는데, 그가 죽음을 앞둔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정기용 건축가를 가까이에서 담아내며 그의 말하는 얼굴을 담던 전반부와는 다른 장면들을 보여준다. 더 이상 카메라는 그에게 가까워지지 않는다. 대신 그의 건축을 겪어내는 사람들의 반응을 담기 시작한다. 건축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출발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 영화가 답해주듯 말이다.
영화는 이데올로기가 세워놓은 굳건한 벽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실패된 송환과, 건축계의 이단아로 불리었던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예감되는 실패 앞에서도 꿋꿋이 피켓을 들고 집을 나서는 비전향 장기수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건축가에 대한 영화가 좌절이나 가벼운 애도로 끝맺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카메라는 지나가는 시간을 부여잡는다. 등장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영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들을 실패와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는 태도로, 말하는 얼굴들의 의지와 존엄을 지키는 두 편의 영화를 기억하고 싶다. 〈2차 송환〉 속 마지막 내레이션처럼 머지않은 미래에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얼굴이 슬픔이 아닌 승리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하는 건축가〉의 정기용 건축가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의 건물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햇살과 목욕물을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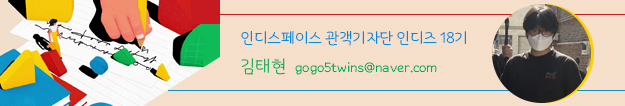
'Community > 관객기자단 [인디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디즈] 〈달이 지는 밤〉인디토크 기록: 죽은 자들의 흔적이 머무는 두 가지의 이야기 (0) | 2022.10.20 |
|---|---|
| [인디즈 Review] 〈성덕〉: 우리는 감정 있는 ATM (0) | 2022.10.18 |
| [인디즈 Review] 〈2차 송환〉: 언어로 염원을 오독오독 긷는 행위의 숭고 (0) | 2022.10.11 |
| [인디즈]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인디토크 기록: 붉은 마음의 윤을 마모시키지 못하도록 둥글게 안아 드는 울음 (1) | 2022.10.07 |
| [인디즈 Review] 〈달이 지는 밤〉: 담담하게 마주하는 죽음의 얼굴 (0) | 2022.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