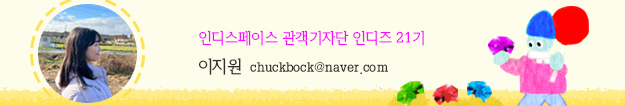[인디즈 단평] 〈장손〉: 사라지는 것, 남아있는 것
*'인디즈 단평'은 개봉작을 다른 영화와 함께 엮어 생각하는 코너로,
독립영화 큐레이션 레터 '인디즈 큐'에서 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 남아있는 것
〈장손〉과 〈이씨 가문의 형제들〉
*관객기자단 [인디즈] 이지원 님의 글입니다.

제사를 맞아 대구의 고향 집에 일제강점기와 베이비붐 세대, X세대와 MZ세대가 모여든다. 안부를 주고받으며 회포를 푸는 것도 잠시, 가업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성진의 발언에 미묘한 긴장이 흐른다.

〈장손〉은 가족의 이야기에 시간의 축을 더해 세대 담론을 끌어낸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성진에게로 이어진 김 씨 가족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민주화를 거친 한국의 근현대사를 반영한다. 두부 공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뿌리에는 시대의 격차가 있다. 수작업을 중시하는 할아버지와 기계를 사용하는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는 대신 새로운 꿈을 찾은 성진은 그 자체로 한 세대를 반영하는 인물이다.
〈장손〉이 세대 간 불통을 관찰했다면, 〈이씨 가문의 형제들〉은 세대를 넘어 통용되는 인습에 의문을 제기한다. 주인공 영서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인 시골집이 장손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는다. 엄마는 집안의 장녀인 자신이 아니라, 죽은 남동생의 아들이 집을 상속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씨 가문의 형제들’이라는 제목과 달리, 영화에서 가문을 지키는 것은 할아버지의 딸과 손녀이다. 유산을 넘겨받은 장손자는 시골집을 팔아버리고, 할아버지의 유골함까지 가져가려 한다. 유골함을 되찾아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준 것은 상속과 제례에서 배제된 가문의 여자들이었다. 이씨 가문을 둘러싼 소동극은 관습과 인습, 익숙함과 낯섦 사이에서 무엇을 지키고 또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장손〉이 가족을 통해, 한 세대의 퇴장을 그리는 마침표의 영화라면, 〈이씨 가문의 형제들〉은 가족 안에서 통용되는 구시대적 가치관에 의문을 표하는, 물음표의 영화다. 〈장손〉의 마지막,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늘봄은 태어난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한 시대가 저물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지금껏 그래왔으니까’라는 말로는 다가올 봄을 맞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