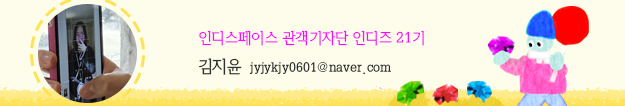[인디즈 Review] 〈장손〉: 카메라와 영화 사이, 〈장손〉이 만들어내는 비밀
〈장손〉리뷰: 카메라와 영화 사이, 〈장손〉이 만들어내는 비밀
* 관객기자단 [인디즈] 김지윤 님의 글입니다.
영화는 스크린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작고 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넓게 펼쳐진 스크린 앞에서 꼿꼿한 자세를 피해 모든 감각을 내던지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한참을 본다. 〈장손〉은 121분의 시간 동안 잘 꿰매어진 가족 구성원들의 사정을 들려준다. 역사, 트라우마, 젠더, 꿈, 현실과 함께 다가오는 〈장손〉 속 이야기들은 구성원의 수만큼 여러 겹이고, 김씨 일가 안에 두터이 자리 잡은 어떠한 우울과 걸핏하면 튀어나오는 분노처럼 복합적이다. 반대로, 〈장손〉의 시선만큼은 철저히 느리게 움직인다. 그 시선은 오히려 대상을 오래도록 붙잡고, 오래도록 지켜보게 만든다. 그렇게 희끗한 잔상처럼 우리 옆에 공존하는 영화 속 이미지들은 등을 돌린 채 전해져오는 인물들의 애환 위에 자주 반복되는 뿌연 두부 공장의 수증기를 닮은 진동을 불러일으킨다.

〈장손〉의 카메라는 진득하게 영화를 쫓다가도 스스로 그 자리를 비집고 나와, 저 멀리 바깥으로, 더 바깥으로 이동한다. 영화가 보지 못한 건 우리도 볼 수 없다. 영화가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우리도 볼 수 없는 것이 된다. 제삿날이 지나는 새벽, 술에 취한 태근(오만석)과 그를 제압하듯 움직이는 성진(강승호)과 수희(안민영), 세 사람은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몸싸움을 벌이듯 얽히더니 카메라는 그들을 거실에 두고 집을 빠져나가 세 사람의 모습을 가려버린다. 제삿날 저녁 곧잘 뒤돌아 성진과 이야기 나누며 뒷정리를 하던 수희의 웃음이 애환 담긴 울음으로 바뀌자, 뒤돌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 없는 수희의 뒤에서 카메라는 묵묵히 그 뒷모습만을 지켜본다. 이렇듯 〈장손〉은 여러 차례 카메라를 사건 혹은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제외시키고, 바깥으로 혹은 인물의 등 뒤로 이동하며 영화가 볼 수 있는 것을 영화의 위치에서 제한함과 동시에 관객의 위치 또한 계속해서 새로이 설정한다. 영화적 제한과 설정에도 불구하고, 〈장손〉은 영화와 우리 사이를 멀찍이 떨어뜨려 두지는 않는다. 가족 개개인의 설움을 세월로써 애써 막아두었지만, 틈새를 비집고 나온 사실들이 가족을 넘어 우리 곁까지 흘러나오면서부터 그 거리감은 비교적 가까워진 듯 느껴진다. 비밀을 듣는 사람은 성진이지만, 어쩐지 관객 또한 끝까지 숨길 수밖에 없는 비밀에 남몰래 함께하게 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그렇게 〈장손〉이 만들어내는 비밀은 카메라와 영화 사이 어딘가로 훌쩍 관객을 데려간다.

〈장손〉에는 큰 비밀들이 있다. 겨울의 이미지가 가득 찰수록, 부엌에 앉은 가족의 수가 점점 적어질수록 그 비밀들은 더욱 형태를 갖추고 불쑥 찾아온다. 병원 복도 한 편에 앉아 지난 별채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성진과 혜숙(차미경), 두 사람의 얼굴은 마주하고 있는 카메라의 반대편 자연광으로 표정을 알 수 없다. 그러다 혜숙의 말 한마디에 드물게 반대편에서 두 사람을 담은 씬을 연이어 보여주며 표정을 읽게 하더니, 성진과 혜숙 사이의 비밀이자 영화와 우리의 비밀이 만들어진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시간을 들먹이며 복도를 떠나는 성진의 안에 이미 비밀은 깊숙이 자리 잡고, 성진과 혜숙 사이, 그 어딘가 위치하여 이들과 함께 비밀을 공유하는 체험을 한다.
잠결에 시작된 승필(우상전)과 성진의 대화 속 비밀은 더 거세게 다가온다. 승필과 성진, 엄밀히 말하자면 승필과 태근의 대화는 승필이 중학생이던 시절 큰 바위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에서 시작한다. 이윽고 태근이 되기로 한 성진은 두부 공장의 물림에 대해서도 그동안 깊은 의문을 갖고 있었던 듯 질문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서울로 떠나는 성진에게 승필이 통장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며 “내 죽더라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는 장면에서는 꼭 성진의 이름으로 모은 통장의 존재 사실 뿐만 아니라, 전날 밤 새벽 승필이 들려준 이야기를 의미하는 듯 들리기도 한다. 손에 꼭 쥐어준 당부는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문 넘어 들어오는 햇빛을 가림과 동시에 자신의 표정마저 가려버리는 성진의 모습처럼, 알 수 없는 기약을 남긴다.
성진을 둘러싸고 함께 품게 된 비밀들은 집 밖 그리고 인물의 뒤편으로 향하던 카메라의 거리감을 단숨에 조여온다. 비로소 가까워진 영화와의 거리에도 무엇도 아는 척할 수도, 말할 수 있지도 않음에 다시 영화가 그리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카메라와 함께 쫓을 뿐이다. 〈장손〉은 여름과 가을, 겨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하루가 흘러가는 것을 빛의 흐름과 함께하는 영화다. 그 ‘흐름’의 과정에서 인물들이 언제부터 품어왔을지 모를 기억, 마음, 아픔은 시간을 거슬러 당도했음에도 자연스러운 통증처럼 계절과 빛의 흘러감에 놓여 있다. 그 순간들을 거스르지 않은 채, 가족사진 뒤에 놓인 큰 아름드리나무처럼 이들의 이동을 지켜본다. 결국, 모두가 그 나무를 지나쳐 간다.